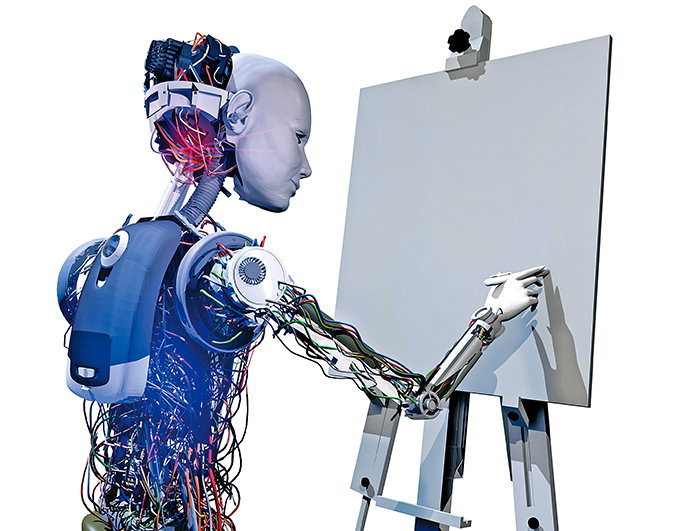 |
봄비가 내리고 있다. 움츠렸던 만물에 활력과 생기를 주는 봄비다. 창 밖에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베란다 화초들과 인사를 나눈다. 베란다에는 다육이 정야가 수백송이 꽃을 피웠다. 해마다 맞는 봄을 새롭게 표현하려니 쉽지 않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단어는 3천개 정도라고 한다. 좀 더 어휘력을 가지고 글쓰기를 하거나 전문용어를 활용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1만2천 단어를 사용한다. 보통 사전에 실려 있는 단어가 8만 단어다. 그런데 미국의 인공지능 연구기관 ‘오픈 AI’가 새로 개발한 글짓기 인공지능은 800만개의 인터넷페이지에 담긴 단어 15억개를 학습했다고 한다.
 |
전문적 글쓰기, 1만 2천개 단어 활용
일상 단어 3천개, 사전 실린 8만 단어
美 개발 글짓기 AI , 단어 15억개 학습
번역 수준서 벗어나 고도의 창작 활동
기사·논문·평론 논리적 글쓰기 가능
체험에서 나오는 감성과 고도의 비유
소설·詩는 AI가 넘보기 어려운 영역
인공지능‘GPT-2’는 사용자가 특정 문장을 넣으면 논리적 순서에 맞게 만들어낼 뿐 아니라 책 한 페이지 분량의 글을 어색하지 않게 빠른 시간에 만들어내니 인간의 글쓰기보다 낫다는 평이다. 판타지 소설이나 뉴스, 학교 숙제 정도는 척척 하고 책 한 권을 빠른 시간 안에 퇴고과정이나 교열 없이 완성해 낼 수 있다. 인공지능‘GPT-2’의 글쓰기 실력이 워낙 뛰어나 연구자들도 놀라 악용이 우려될 것을 걱정하여 원천기술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언제부터 글을 썼는지 궁금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로 시작하고 있다. 말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며, 말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인류 최초의 책은 어떤 책인가. 말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그것을 기록해야 했다. 처음에는 짐승의 뼈에다 선을 그어 표시를 했다고 한다. 사물과 닮은 형상의 기호를 사용하다 글자를 만들었을 것이다. 점점 진화되어 수메르인들은 진흙 판을 만들어 거기다 써놓았지만 부서지고 물이 닿으면 녹아버려 보존할 수 없었다. 이집트인들은 파피루스에 암호화된 상형문자로 기록했다. 그 책은 죽은 자의 관에 들어있는 부장품이었다. 나중에 그 상형문자를 해석해보니 망자를 위한 저승여행 안내서로 그 책이 바로 ‘사자의 서’다. 다음 세상에 잘 도착하길 기원하는 기도문이란다. 중국여행 중에 박물관에서 BC 2~3세기경의 유물인데 대나무껍질을 엮어 아주 가는 세필로 글을 적어 놓은 것도 보았다. 중국지역의 초기 책의 일종인 것 같았다. 현재 BC 2000년경 수메르에서 문자로 기록한 ‘길가메시의 서사시’를 가장 최초의 책으로 보고 있다. 모든 신화의 원형이며 가장 위대한 책 성경의 모티브로 보기도 한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글을 잘 지어낸다니, 칼럼은 한 두 문장만 입력하면 단 몇 분이면 써낸다고 하니 컴퓨터 앞에 몇 시간째 앉아 생각을 가다듬어 뚝딱거리고 있는 나는 그 기사를 읽고 맥이 빠진다. 뭐 그래도 나는 쓴다. 사실 글쓰기는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꿈꾸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GPT-2’는 상상을 초월하는 단어 수와 어휘력을 습득했으니 겨우 1만2천 정도의 단어를 활용하는 사람과의 글쓰기 격차는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인간의 영역인 예술과 창조에 도전하게 된 AI에 대해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 인공지능 글쓰기가 사람이 쓰던 글쓰기의 경계를 허물었다. 인공지능이 나날이 발전해가니 인공지능이 글 쓰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상은 했다. 글짓기 인공지능은 밤낮 없이 지치지 않고 남을 의식하지 않으며 모든 표현이 가능하다. 설득과 감동까지도 담아낸다. 번역 수준에서 벗어나 고도의 창작 활동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2017년 중국이 개발한 ‘샤오이스’는 현대시인 519명의 작품 수천 편을 100시간 동안 학습해 1만여 편의 시를 쏟아냈다. 그중 어색하지 않은 작품 130여 편을 가려 시집의 제목도 ‘샤오이’가 직접 지어 ‘햇살은 유리창을 잃고’라는 제목의 시집을 발간하기도 했는데 문맥이 어색했다고 한다.
하여간 글쓰기에 위기감이 느껴진다. 이성과 논리적인 글쓰기인 기사와 논문, 평론은 안전지대가 아니나 다행히 소설이나 시는 글쓰기 인공지능이 넘보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한다. 직관과 예민한 감성과 고도의 비유는 작가의 체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마침 비가 오고 있어 시인의 촉수가 잘 느껴지는 시를 옮겨본다.
“밭둑가 덩그런 컨테이너 지붕에 모여 우는,/ 미간만큼 열린 창틀 사이에/ 오종종 모여 우는,// …// 가지 끝에 기어이 망울 하나 낳아놓고/ 겨우내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던,/ 왜 우느냐고 물어도 설명하지 못하는,/ 주름치마 성글게 고쳐 입은/ 여인의 텅 빈 눈 속으로 젖어들어/ 뚝뚝, 서럽게/ 서럽게 우는 봄비여”(우영규, ‘봄비, 망울 하나 낳아놓고’중에서)
봄비는 소리와 냄새부터 다르다. 소리도 없이 겨우내 숨죽였던 새순들 다치지 않게 보슬보슬 비가 온다. 빗방울이 방울방울 모여 천천히 젖어드는 것까지도 시인은 터득하고 빗방울이 “지붕에 모여 우는” “오종종 모여 우는”이라 했다. 컨테이너박스 지붕으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우는 소리로, 빗방울이 눈물로 화자의 심상에 반영되었다. 겨우내 가물어서 비 한 방울 오지 않다가 드디어 내리는 봄비를 두고 “겨우내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던”이라 표현했다. 주름치마 성글게 입은 여인은 다른 연상으로도 이어지겠지만 밭고랑의 비유다. 밭은 대지의 모신이라 하지 않는가. 씨 뿌리기 전 텅 빈 밭에 내리는 비를 “텅빈 눈 속으로 젖어들어”그냥 우는 게 아니라 서럽게 운다 했다. ‘오종종’과 ‘뚝뚝’의 의성어와 ‘모여 우는’과 ‘서럽게’를 반복한다. 내면으로 흐르는 묘한 리듬이 있어 봄비 오는 정경이 눈에 선하다.
시에서 소리들이 내는 울림은 미묘한 반향을 불러일으킨다. 리듬은 읽는 사람에게 어떤 감정 상태를 유발시킴으로써 그 자체로 무언가를 말하게 한다. 이 부분은 예술 영역에 도전하는 글쓰기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글짓기 AI 스스로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을뿐더러 전체를 파악하는 능력과 한번 보면 척 알아보는 직관과 예민한 감성이 없다. 미래에는 인간의 직관이 더욱 중요하다. 이미 아인슈타인이 “인간에게 가장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은 직관”이라고 했다.
시인·문학평론가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박재일의 직설사설] `윤석열`의 굴복? `뉴노멀시대`](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404/2024041900151914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