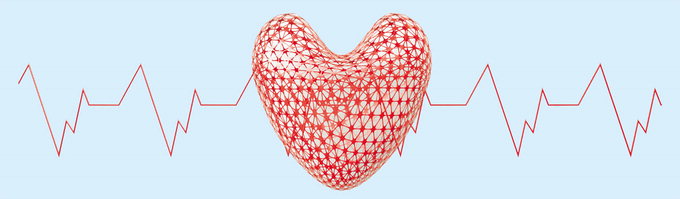 |
대동맥은 인체에서 가장 큰 혈관으로 심장의 좌심실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혈액이 온몸으로 공급되는 주 통로 역할을 맡고 있다. 성인에서의 직경은 3㎝ 정도다.
심장에서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상행대동맥, 활처럼 휘어져 있는 궁부대동맥,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하행흉부대동맥, 복강 내로 이어지는 복부대동맥으로 나눠지며, 많은 혈류량과 높은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한 구조로 이뤄져 있다.
대동맥의 혈관 벽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약해지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대동맥류가 생기는데, 자연경과를 보면 점차 혈관이 확장되면서 결국 대동맥이 파열돼 순식간에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되는 무서운 병으로 알려져 있다.
대동맥류는 크기가 5㎝를 넘어선 경우 수술을 통해 늘어난 대동맥류를 제거하고 인공혈관으로 갈아넣는 방법이 지금까지의 확립된 치료방법이었다. 하지만 수술을 위해서는 인공심폐기의 사용, 체온을 20℃까지 내린 후 전신의 혈액공급을 차단하는 완전 순환정지 등의 복잡하고 어려운 기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술시간이 길다. 이뿐만 아니라 합병증이나 후유증의 발생 위험이 높아 수술사망률이 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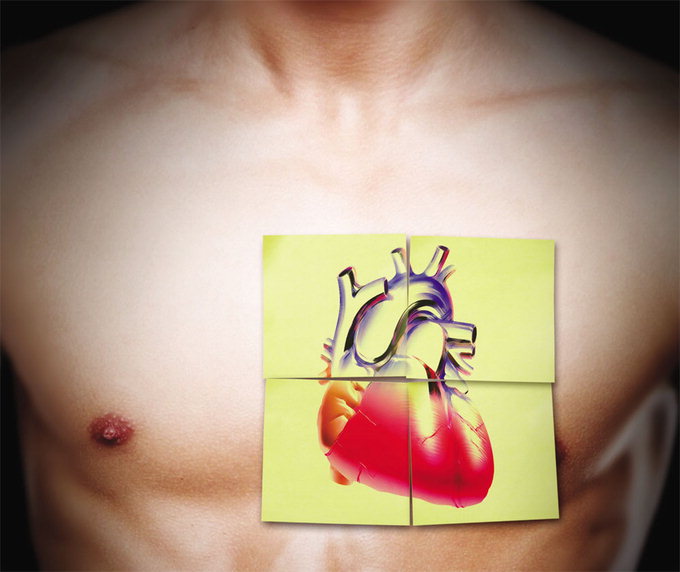 |
요즘은 하이브리드란 용어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데 이를 의료에 도입해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치료기술을 복합적으로 적용했다. 즉, 병소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치료하는 외과적 수술법과 영상장비를 이용한 내과적 시술법을 융합함으로써 환자에 대한 침습성은 최소화하면서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신 치료법을 하이브리드 술식이라고 부른다.
컴퓨터단층촬영 검사에 상행대동맥, 궁부대동맥, 하행흉부대동맥이 모두 7㎝ 이상 늘어나 있어 대동맥류로 진단된 60대 여성 환자의 경우 과거엔 두 차례로 나눠 가슴과 옆구리를 각각 절개하는 대수술이 필요했다. 하지만 최근엔 수술의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 내과적 시술로 해결할 수 없는 부위만 수술로 치료하고, 남은 부위는 부분마취 하에서 영상장비를 이용해 스텐트 그라프트(금속 그물망을 씌운 인공 혈관)를 삽입하는 하이브리드 술식을 적용하면 된다.
우선 1단계 치료는 전통적인 수술법으로 대동맥판막을 인공판막으로 교체한 후 상행대동맥과 궁부대동맥 전체를 인공혈관으로 갈아넣는다. 2차 시술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인공혈관의 여유분을 하행흉부대동맥에 남겨두고 나오는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게 된다. 이후 2단계 치료로 내과적 시술을 통해 1차 수술에서 궁부대동맥의 원위부에 남겨둔 인공혈관 안에 스텐트 그라프트를 삽입함으로써 대동맥류를 완전하게 치료한다.
2단계 치료는 기존의 옆구리를 따라 50㎝ 정도 절개하는 후측방개흉술 대신에 사타구니 부위의 대퇴동맥 위에 2㎝만 절개해 1시간반 정도의 시술 시간으로 모든 치료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는 수술에 대한 부담도 덜고 회복기간도 훨씬 빠른 이점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사례를 들면 50대 남성 환자로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복부대동맥과 궁부대동맥의 대동맥류로 진단받았는데, 복부대동맥류에 대해서만 수술을 받았다. 병원을 찾을 당시 컴퓨터단층촬영 결과에서 궁부대동맥과 하행흉부대동맥에 걸쳐 6㎝ 조금 넘는 크기의 대동맥류가 있었다. 또 관상동맥조영술 검사에서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하는 오른쪽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있는 관상동맥질환(협심증)이 동반돼 있었다. 이 환자의 경우 내과적 시술만으로 대동맥류를 치료하기에는 위치가 좋지 않았는데 시술 중에 궁부대동맥에서 왼쪽 머리로 올라가는 동맥을 막아 중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 관상동맥질환에 대한 치료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하이브리드 술식을 적용했다.
1차 수술은 가슴 정중앙을 절개해 복제정맥을 이용한 관상동맥우회로술을 먼저 시행하고 머리로 가는 동맥을 상행대동맥에 새로 연결하여 위치를 이동함으로써 궁부대동맥류에 대한 내과적 시술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미리 예방하는 술식을 적용했다. 2차 시술은 대퇴동맥 위에 2㎝의 절개만 하고 안전하게 스텐트 그라프트를 삽입했다.
하이브리드 술식은 1차로 비교적 간단하게 수술을 하면서 수술과 동시에 스텐트 그라프트를 삽입하거나, 수술 후 안정된 다음 통상적인 수술방법 대신에 다리의 대퇴동맥을 통해 스텐트 그라프트를 삽입하는 등의 치료법을 혼합해 적용한다. 이는 전통적인 치료방법에 비해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고 회복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동일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이다.
그러나 아직은 스텐트 그라프의 10년 이상 장기 임상 성적이 확립되지않은 상황이어서 젊은 환자에게 시술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다. 이 때문에 고령 또는 수술의 합병증이 예상되는 환자나 응급상황, 재수술 등 수술의 위험부담이 큰 환자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도움말= 박남희<계명대 동산병원 흉부외과 교수>

임호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상] 대구 표심 잡기 나선 김문수 “이재명보다 몇십배 더 일했는데 수사 한번 안 받았다”](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04/news-m.v1.20250420.a89a3cd178b94554be29e43ca14ee2c4_P1.jpg)





